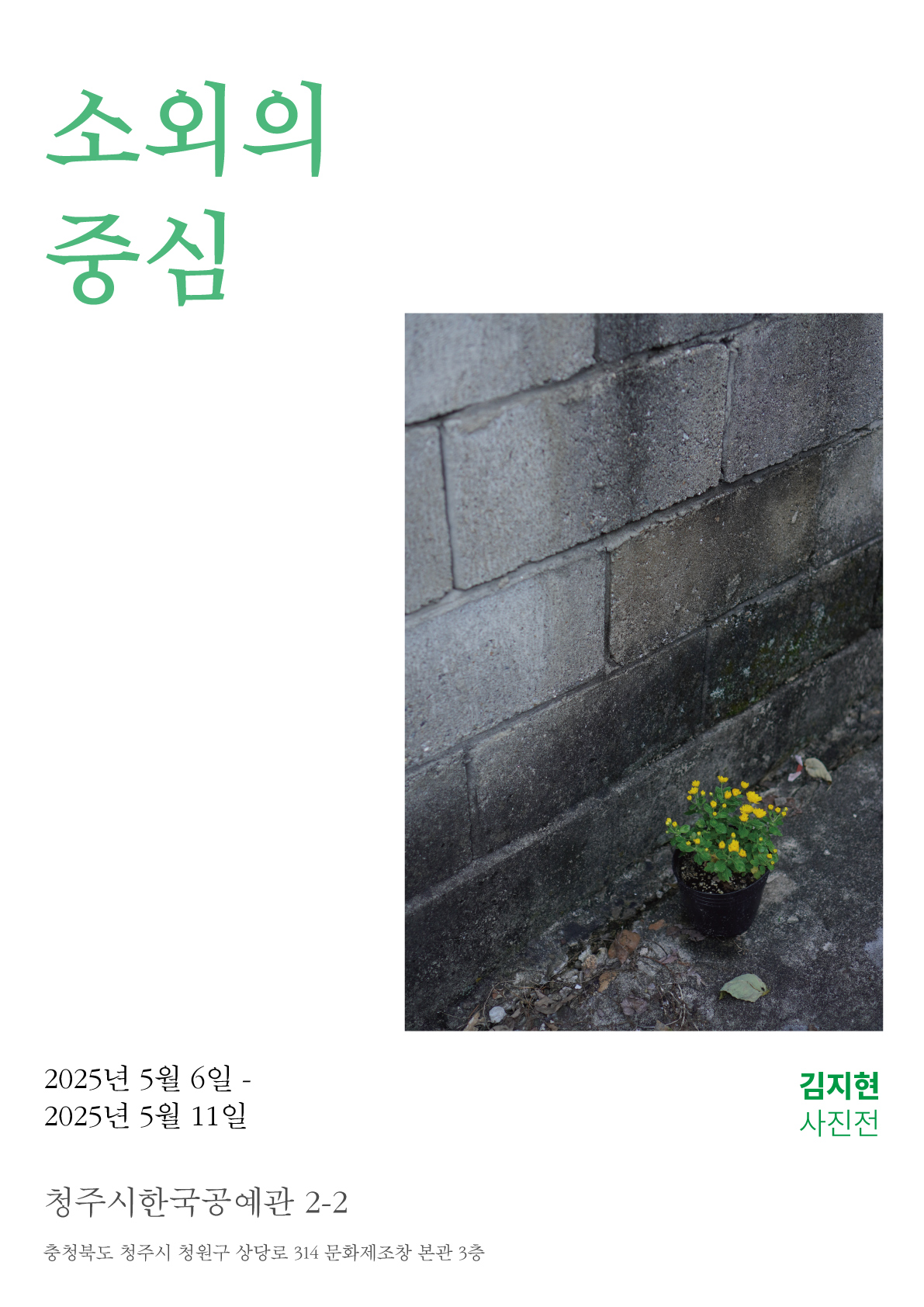처음에는,
집 안에서만 사진을 찍었다.
익숙하고 고요한 공간.
텅 빈 의자, 벽에 드리운 햇빛의 그림자.
익숙했지만,
그 안에는 낯선 감정들과 말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 숨어 있었다.
그러다 어느 날,
현관문을 열고 나갔다.
동네를 걸었다.
익숙하지만 멀게 느껴졌던 풍경이
어느 순간, 마치 집 안의 일부처럼 다가왔다.
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,
동네를 벗어나 바깥으로 향하게 되었다.
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,
차가운 콘크리트 사이 피어난 초록들.
‘이곳에선 자랄 수 없을 거야’
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.
하지만 그 풀들은 묵묵히 버티며 피어 있었다.
그리고 나는 문득,
내가 지나온 시간과 그 생명들을 겹쳐 보게 되었다.
어쩌면,
나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.
주어진 자리에서,
묵묵히, 조용히
나를 지키며.
이 사진들은
그 여정의 기록이다.
집이라는 가장 안쪽에서 시작된 시선이
점점 바깥을 향해 번져가며
결국, 나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.
소외된 자리에 피어난 초록처럼
나 또한 그 자리에서
나를 지탱하고 있었다.